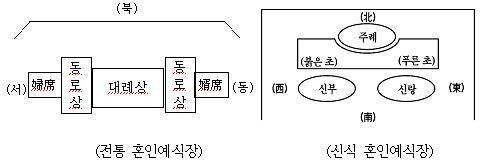축문 용어
․감(敢) : 감히.
․감망(敢忘) : 감히 잊을 수가 있겠는가?
․감모(感慕) : 마음에 느껴 사모함.
․감소고우(敢昭告于) : 삼가 밝게 아뢰옵니다.
․건고근고(虔告謹告) : 정성들여 고하고 삼가 고함
․건자택조(建玆宅兆) : 무덤을 이룸.
․경신전헌(敬伸奠獻) : 공경하는 신께 전을 올림
․고애자(孤哀子) : 어버이를 모두 여윈 바깥 상주가 자기를 일컫는 말.
․공수세사우(恭修歲事于) : 공손하게 제사를 올림
․공신(恭伸) : 공손하게 펼치다.
․공신전헌(恭伸奠獻) : 공손하게 전(奠)을 드림
․귀근지시(歸根之時) : 풀과 나무의 뿌리까지 기운이 거두어지는 계절이라는 뜻
․근고(謹告) : 삼가 아뢰다.
․근구모물(謹具某物) : 비지(碑誌), 상석(床石), 망주(望柱), 석인(石人) 등 건립하는
석물에 따라서 쓰게 된다.
․근미심자시(謹未審玆時) : 삼가 아직 살피지 못한 이 때
․근이(謹以) : 이에 삼가
․근이주과(謹以酒果) :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올려.
․근이청작(謹以淸酌) : 삼가 맑은 술을 올려.
․금신불유(今辰不留) : 영을 받아 더 머무를 수 없음
․금이계추(今以季秋) : 지금 계절은 가을입니다.
․금이득지(今以得地) : 이제 묘자리를 얻었음.
․금이초목(今以草木) : 풀과 나무를 뜻하는 말
․기서(氣序) : 세월의 기운이 바뀌어 가는 차례.
․기서유역(氣序流易) :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뀜
․둔석(窀穸) : 무덤의 구멍, 무덤.
․득지어(得地於) : 땅을 마련해
․망극(罔極) : 부모의 상을 당하여 그지없이 슬픔.
․망일부지(亡日復至) : 죽은 날이 다시 돌아 옴
․매우묘소(埋于墓所) : 묘소에 묻음.
․명일장천(明日將遷) : 날이 밝으면 옮김
․모관모군(某官某君) : 벼슬이 있으면 관직을 기재하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부군(學
生府君)이라 기재.
․모관모씨(某貫某氏) : 본관과 성씨.
․모명(某名) : 제사의 제주 되는 이의 성을 뺀 이름
․모봉(某封) : 부(夫)의 관직에 따른 직첩을 기재하고, 벼슬이 없으면 ‘유인’이라 기재
․비통무이 지정여하(悲痛無已至情如何) : 슬프고 아픈 마음 비할 데 없고 정을 어디에
비하리오 하는 뜻
․모좌지원(某坐之原) : 묘를 어느 방향으로 잡음
․몰(沒) : 죽음.
․몰녕감망(沒寧敢忘) : 돌아 가셨지만 편안하신 지 잊을 수가 없다는 뜻
․반구지가(返柩之家) : 영구가 집에 돌아 옴
․백로기강(白露旣降) : 찬이슬이 벌써 내렸다는 뜻
․보우(保佑) : 보호하고 도움.
․복유(伏惟) : 삼가 생각하건대.
․봉영(封塋) : 조상의 무덤을 높이는 말.
․부군(府君) : 돌아가신 아버지나 남자 조상에 대한 존칭
․부우묘좌(祔于墓左) : 묘 왼편에 합장.
․부자승감(不自勝堪) : 감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함
․부제(祔祭) : 3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올리는 제사.
․부진불경(不震不驚) :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라는 뜻
․불승(不勝) : 감정을 스스로 억눌러 견뎌내지 못함.
․불승감모(不勝感慕) : 그리워하는 마음 금할 수 없음
․불승감창(不勝感愴) :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음
․불승비창(不勝悲愴) :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함
․불승영모(不勝永慕) : 사모하는 마음 금할 수 없음
․비념상속 심언여훼(悲念相續心焉如燬) : 슬픈 생각이 연달아 마음이 편치 않음
․비도산고 부자승감(悲悼酸苦不自勝堪) : 슬프고 괴로움을 견디어 내지 못함
․비무(俾無) : 하여금 없다.
․빙(憑) : 기댈 빙, 귀신들린 빙
․사구종신(舍舊從神) : 옛것을 버리고 새 것(신주)에 따름
․삭(朔) : 상을 당한 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축문에는 언제나 쓰임
․상로기강(霜露旣降) : 찬 서리가 이미 다 내렸다는 뜻
․상사(祥事) : 소상.
․상향(尙饗) : 이제 흠향하시옵소서. 축문, 제문의 끝에 씀
․생시유경(生時有慶) : 살아 계실 때와 같이 경사를 베푼다는 뜻
․생신부우(生辰復遇) :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 날이 다시 돌아 왔다는 뜻
․서수(庶羞) : 여러 가지 음식.
․선비(先妣) : 돌아가신 어머니.
․성물지시(成物之始) : 만물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
․성물지시(成物之始) : 만물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.
․성상재회(星霜載會) : 묵은 해가 넘어 갔다는 뜻
․세사(歲事) : 일년 중에 일어나는 일.
․세서천역(歲序遷易) : 해가 바뀌어
․세시(歲時) : 조상을 생각하여 감회가 깊을 때.
․세천일제(歲薦一祭) : 일년에 한번 돌아오는 제사라는 뜻
․숙흥(夙興) : 아침 일찍 일어나다.
․숙흥야처(夙興夜處) : 하루 종일
․시빙시의(是憑是依) : 여기에 기대시고 여기에 의지함
․식준조도(式遵祖道) : 할아버지 법도에 따라 가겠습니다.
․신뢰신휴(實賴神休) : 신령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
․신주(神主) : 죽은 사람의 위패(位牌).
․신주기성 복유(神主旣成伏惟) : ‘신주를 만들고 삼가 생각하옵건데’라는 뜻. 신주를
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신주미성(神主未成)이라고 쓰며,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
람일 때에는 복유(伏惟)을 유령(惟靈)이라고 씀
․신주미황(神主未遑) : 겨를이 없어 신주를 만들지 못함
․실당(室堂) : 예전에 살던 집.
․심훼비념(心燬悲念) : 슬픈 마음이 가슴을 다 태움
․애모불녕(哀慕不寧) :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편치 못함
․애천(哀薦) : 돌아가신 어버이를 슬퍼하며 사모함.
․애천협사(哀薦祫事) : 슬픈 마음으로 제사를 지냄
․야처(夜處) : 밤에 이르기 까지
․양봉(襄奉) : 장례를 모심
․엄(奄) : 가릴 엄, 갑자기 엄.
․엄급(奄及) : 문득 이르다.
․엄급초우(奄及初虞) : 어언 초우가 돌아옴
․영건(營建) : 묘를 만드는 일.
․영건택조(營建宅兆) : 무덤을 세우고자 한다는 뜻
․영결(永訣) : 생자(生者)와 사자(死者)의 영원한 이별.
․영모(永慕) : 길이 사모함.
․영이(靈輀) : 영구차, 행상, 상여.
․영천지례(永遷之禮) : 영원히 가시는 예
․예불감망(禮不敢忘) :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하였다는 뜻
․예유중제(禮有重制) : 예의를 갖추어라는 뜻
․요급회갑(邀及回甲) : 회갑날을 맞이하였다는 뜻
․용신건고(用伸虔告) : 경건하게 고하다.
․우로기강(雨露旣降) : 어느덧 비 내리고 이슬이 내림
․우로기유(雨露旣濡) : 비와 이슬에 이미 젖다.
․원(原) : 언덕.
․월간지삭(月干支朔) : 제사 지내는 달의 초하루 간지
․유세차(維歲次) : 때가 이르러 이에 간지에 따라 정한 해로 말하면
․유세차간지(維歲次干支) : 제사 지내는 해의 간지
․유시보시(維時保佑) : 계속 보호하고 돌봐 줌
․유역(流易) : 흘러서 바뀌다.
․유택(幽宅) : 무덤, 사자(死者)의 집.
․유학(幼學) :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.
․유학(幼學) :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것. 벼슬이 없을 때 쓰임
․이자상로(履玆霜露) : 찬이슬을 밟으라는 뜻
․일간지(日干支) : 제사 지내는 날의 간지
․일월불거(日月不居) : 세월이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뜻
․자이(玆以) : 이에 지금부터
․자좌(子坐) : 묘자리의 방향을 나타냄. 자좌(子坐)는 묘지의 좌향(坐向). 묘의 좌
향에 따라 달라짐.
․재진견례(載陳遣禮) : 가시는 예를 베풀다라는 뜻
․적(適) : 갈 적, 천히 할 적, 뜻을 좇을 적
․정하가처(情何可處) : 비통한 마음 어찌할 바 모름
․정하비통(情何悲痛) : 비통한 마음 어찌할 바 모름
․존기유경(存旣有慶) : 살아 계셨더라면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뜻
․존령(尊靈) : 손윗사람의 영혼을 높여서 하는 말이다. 처 또는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
람에게는 유령(惟靈)이라고 씀
․종천(終天) : 세상이 끝남, 영원함.
․증조고(曾祖考) : 돌아가신 증조부를 높이는 말.
․지천세사(祗薦歲事) : 제사를 올림
․지천우신(祗薦于神) : 삼가 신령에게 제물을 받들다의 뜻
․진차(陳此) : 처나 아우들에게 ‘제수를 차려 놓으니...’라는 뜻
․진차전의(陳此奠儀) : 여러 음식을 차려 전을 올림
․창모(愴慕) : 그리워서 마음이 아프고 슬픔.
․천(薦) : 천거할 천, 공물을 바칠 천.
․천차(薦此) : 방친(傍親)에게 쓰는 말로 ‘이를(제수) 드리니 ...’라는 뜻
․첨소(瞻掃) : 삼가 우러러 청소를 한다.
․첨소봉영(瞻掃封瑩) : 산소를 벌초하고 깨끗하게 함
․청작(淸酌) : 맑은 술.
․청작서수(淸酌庶羞) : 맑은 술과 여러 음식
․청천구(請遷柩) : 영구를 옮길 것을 청한다는 뜻
․초목기장(草木旣長) : 풀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는 뜻
․추원감시(追遠感時) : 추모하는 마음이
․추유보본(追惟報本) : 선조님의 산소를 바라본다는 뜻
․택조(宅兆) : 무덤의 광중(壙中)과 벽 안의 총칭.
․폄자유택(窆玆幽宅) : 무덤이 여기에 정했다는 뜻
․헌(獻) : 정성스럽게 바치다.
․현(顯) : 나타날 현
․현고(顯考) :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방 첫머리에 쓰는 문구
․현벽(顯辟) : 죽은 남편의 지방 첫 머리에 쓰는 문구
․현비(顯妣) :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방 첫머리에 쓰는 말
․현조고(顯祖考) : 돌아가신 할아버지 지방 첫머리에 쓰는 말
․현조비(顯祖妣) : 돌아가신 할머니 지방 첫머리에 쓰는 말
․현증조고(顯曾祖考) :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지방 첫머리에 쓰는 말
․현형(顯兄) : 돌아가신 형님 지방 첫 머리에 쓰는 문구
․협(祫) : 합사(合祀)할 협.
․호천(昊天) : 넓고 큰 하늘.
․호천망극(昊天罔極) : 부모의 은혜는 하늘같이 크고 넓다는 뜻
․후간(後艱) : 뒤에 어려움, 후환, 뒤탈.
․휘일부림(諱日復臨) :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옴
'국가공인예절지도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친척호칭조직표,가족호칭도표,촌수호칭,가족호칭표- 촌수계보도 (0) | 2020.03.31 |
|---|---|
| 사람마다 이 4단 을 가지고 있다. (0) | 2020.03.29 |
| 예절의 색상 (0) | 2020.03.14 |
| 장례예절 (0) | 2020.03.14 |
| 예절의 방위 (0) | 2020.03.14 |